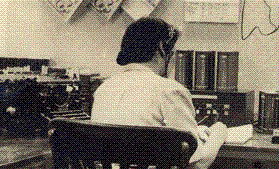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탈북자 WP 기고 “장마당 세대가 북한의 미래” 본문
탈북 대학생 박연미 씨가 지난 4월(2014) 호주 SBS 방송에 출연해 북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북한의 이른바 장마당 세대 출신 탈북 여성이 미국 유력지에 실은 글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수령에 대한 충성도가 낮고 변화에 익숙한 장마당 세대가 북한의 희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유력지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25일 한국의 탈북 여대생 박연미 씨가 쓴 ‘북한 장마당 세대의 희망’ 이란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장마당 세대는 1990년대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태어난 세대로, 국가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장마당을 통해 시장경제를 체득한 세대를 말합니다
박 씨는 기고문에서 장마당 세대가 북한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라며 장마당 세대의 특징을 세 가지로 꼽았습니다.
우선 김 씨 왕조에 대한 헌신 (충성)이 없으며, 세뇌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1994년 사망한 김일성 주석에 대한 기억도 없다는 겁니다.
1993년 생인 박 씨는 자신과 같은 세대 일부가 겉으로는 수령에게 존중을 표하지만 이는 성분사회에서 특권을 잃지 않기 위한 것일 뿐 진정한 충성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장마당 세대가 외부 매체와 정보에 익숙하다며, 한국의 드라마 등을 시청한 북한의 많은 젊은이들은 한국사회를 동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이어 장마당 세대는 어릴 때부터 부모와 함께 물건을 사고 판 경험이 많다며, 자본주의에 익숙하고 개인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장마당이 정권의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부에 대한 열망을 불어 넣어 성분제도까지 허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전통적인 성분 구조가 장마당을 통한 시장화 과정 속에 물질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 북한대학원대학교의 이우영 교수는 과거 ‘VOA’와의 인터뷰에서 장마당 세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우영 교수] “이 (장마당) 세대들은 정말 북한의 어려운 것만 봤고 좋았던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들이거든요. 또 이 시기에 교육체제도 좀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념교육이나 사상교육이 굉장히 약하게 들어갔고 반면에 외부 문화와는 접촉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은 아무래도 기존 세대들하고는 좀 다른, 정치사회적 성향을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교수는 특히 장마당 세대가 북한의 배급망이 붕괴된 전후에 태어나 장마당에 의존해 살았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 대학생 박연미 씨는 기고문에서 북한에서 주체사상은 죽고 장마당이 부각되고 있다며, 장마당 세대가 북한사회 변화의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대다수 북한주민, 장마당서 시장경제 경험
지난 2011년 북한 라선의 자유무역지대에서 북한 여성들이 매매 물품을 머리에 이고 걸어가고 있다.
지난 90년대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던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에서는 시장화가 급속도로 진행됐으며 현재는 북한 주민 대부분이 장마당 등에서 비공식 경제활동을 하면서 시장경제를 배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09년 인구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북한의 16세 이상 인구 천 7백여 만 명 가운데 83%가 시장을 통한 비공식 경제활동의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0년대 기근 피해가 심했던 함경남도의 시장화 비율은 90%가 넘고, 배급 경제가 가장 잘 돌아간다는 평양조차도 56%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발표한 ‘2013년 북한 이탈주민 의식과 사회변동 조사’에 따르면 탈북자의 70% 이상이 북한에서 장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당원 출신도 68%가 장사를 해봤다고 답했으며 특히 30대 92%, 40대 88% 등 젊은 층일수록 장사경험이 많았습니다.
장사경험이 있는 탈북자들은 소매장사, 외화벌이,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파는 ‘되거리 장사’ 등이 주수입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42%가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생활비는 전혀 없었다고 답한 반면, 장사 등을 통한 가구 수입이 100만원 미만과 50만원 미만이라고 답한 사람이 각각 13%, 30만원 미만 31%, 10만원 미만이 16% 였습니다. 1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도 15%나 됐습니다.
주민 10명 중 8명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만 원도 못 받은 반면, 7명 이상이 시장에서 10만 원 이상을 벌었다는 겁니다.
IBK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북한의 배급제가 무너지고 국영상점을 통한 상품공급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시장을 통해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북한 내에서 이런 자본주의적 요소가 들어간 시장경제가 확산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향후 남북 경제가 통합됐을 때 통합에 대한 부작용을 줄이는 것이고 통합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남북한 경제가 통합될 때 북한이 겪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 초기에는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유럽식 모델과 시장경제 체제를 일부 혼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자유화 민주화운동 세력-탈북민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북한, 한국 망명 선원 2명 송환 거듭 촉구...한국 거부 (0) | 2014.06.06 |
|---|---|
| 동해 표류 北주민 3명 구조..2명 귀순 의사 (0) | 2014.06.02 |
| 북한, 올 9월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공식 발표 (0) | 2014.05.24 |
| 한국 시민들이 풍선으로 북한을 향해 초코 파이 발사 (0) | 2014.05.18 |
| 민주연합(민주전선) "자유민주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자 연합정부" (0) | 2014.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