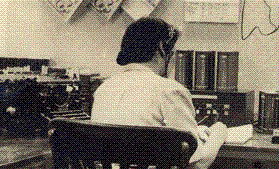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북한전망대] 북한의 헌법개정 본문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북한 밖에서 일어나지만 북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들을 진단하는 뉴스해설 ‘박봉현의 북한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헌법개정’에 관해 이야기해 봅니다.
미국 헌법은 1787년 작성되고 이듬해인 1788년 발효된 이후 1992년까지 18차례에 걸쳐 모두 27개 조항이 수정됐습니다. 1791년 법제화한 수정헌법 제 1조는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명시하고, 제 4조는 영장 없는 수색과 압수를 금지했습니다. 제 5조는 재판과정이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진행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조항들은 공권력이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울타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1865년 제정된 수정헌법 제 13조는 노예제를 폐지했습니다. 1870년 수정헌법 제 15조는 인종에 관계없이 미국시민 남자는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1920년 수정헌법 제 19조가 여성의 참정권을 명문화했습니다. 백인종이든, 흑인종이든, 황인종이든 피부색으로 차별받지 않고 또 여자라고 차별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1951년 제정된 수정헌법 제 22조는 대통령의 임기를 두 번으로 제한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연임으로 제한하는 게 관례였지만 수정헌법 제 22조는 장기집권에 대한 야욕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미국 헌법은 이처럼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헌법이 수정됐다는 점보다는 수정조항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지켜지지 않는 법은 죽은 법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행되지 않는 법은 애당초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주민들에겐 아무 이익이 되지 못하면서, 위정자에겐 ‘법에 따라 지도하는 지도자’로 선전할 수 있는 구실을 주기 때문입니다.
한국 헌법은 1948년 제정돼 9차례 개정됐습니다. 4.19 시민혁명과 5.16 군사정변, 그리고 유신조치 등 우여곡절 끝에 1987년 현행 헌법이 탄생했습니다.
이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 평화적인 정권 이양, 언론자유 보장, 정치범 사면 및 복권 등 민주화의 초석을 다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민주 헌법으로 불립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은 모두 헌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개정된 조항에 더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국민은 정치인들이 헌법조항을 당리당략이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이용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문제가 생기면 법 테두리 안에서 집단행동도 불사합니다.
북한 헌법은 1948년 제정돼 3차례 개정됐습니다. 지난 4월 개정헌법이 마지막입니다. 이 개정헌법이 주목거리입니다. 기존 헌법 제29, 40, 43조 등 3개 조문에 들어 있던 ‘공산주의’란 단어가 빠지고 제3조에 ‘선군 사상’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기존 헌법에서 ‘공산주의’를 삭제한 이유에 대해 “공산주의는 파악이 안 된다”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론상 계급이 하나뿐인 사회인 공산주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김 위원장은 ‘공산주의’ 대신 ‘선군 사상’을 앞세워 사회주의를 제대로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주창해 온 선군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승격해 권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가 개정헌법에 반영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헌법개정으로 북한의 영구 주석인 김일성과 대등한 지위에 오른 셈입니다.
개정헌법 제106조에서 김 위원장이 맡은 ‘국방위원회’를 북한의 ‘최고군사기관’에서 ‘최고국방지도기관’으로 격상한 것이나, 제100조에서 ‘국방위원장’을 ‘북한의 최고영도자’로 추켜세운 것은 북한 주민보다는 김 위원장 개인을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개정헌법은 김 위원장이 당.정.군을 완전히 장악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제11조에서 국가기구에 대한 당의 영도를 정당화하고 있지만, 가뜩이나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북한인데 이번 헌법개정으로 김 위원장의 권력은 난공불락의 요새가 됐습니다.
개정헌법에서 하나 긍정적으로 주목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근로 인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제8조입니다. 북한정부가 그동안 도외시해 온 주민의 인권보호에 관심을 두겠다는 태도 변화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반면, 인권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해가려는 의도가 담겨 있어 별다른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인권보호 조항 신설의 진정성 여부는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정부의 구체적인 행동으로만 판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치범수용소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갇힌 사람들이 적지 않으며, 먹고살 길을 찾아 탈북했다 강제북송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Guide Ear&Bird's Eye22 > 북한[PRK]' 카테고리의 다른 글
| N Korea human rights 'abysmal' (0) | 2009.10.23 |
|---|---|
| “정상회담 제의는 식량난 타개 등 다목적” (0) | 2009.10.23 |
| [김씨 왕조의 실체] 김정일 위원장의 세 아들 (0) | 2009.10.20 |
| [김씨 왕조의 실체] 김정은은 누구? (0) | 2009.10.20 |
| [김씨 왕조의 실체] 주목되는 김정남의 운명 (0) | 2009.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