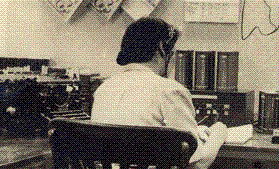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로모노소프대학 출신이며 우즈벡공화국 타슈겐트주 당비서 허가이(許哥而) 본문
로모노소프대학 출신이며 우즈벡공화국 타슈겐트주 당비서 허가이(許哥而)
CIA Bear 허관(許灌) 2008. 6. 1. 12:10허가이(許哥而, 러시아어: Алексей Иванович Хегай, 1890년 ~ 1953년) 함북 출생.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 소련으로 이사하여 모스크바의 로모노소프대학을 졸업하였고, 우즈베크공화국 타슈켄트주당(州黨) 비서를 지냈으며 8·15광복 후 귀국한 소련파의 거물이다. 1946년 북로당 중앙위원회 조직부장, 상무위원 겸 정치위원이 되었고, 북한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으로 뽑히기도 하였다. 1949년 박헌영과 함께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1951년에는 부수상에 올랐으나, 평소 김일성의 독재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1953년 3월 박헌영계(系)와 종파를 조성한다는 이유로 숙청당 하게 되자 자살하였다
1.소련파----소련군 대일참전 정찰국 출신(사진인물, 김일성. 김책)과 소련공산당 출신(사진 인물, 허가이)
(1)소련지역에서 소련공산당이나 소련정부에 참여한 인사들
(2)분류
ㄱ.소련군 정찰국이나 대일참전부대---김일성. 김책등 소련군 극동사령부 정찰국 요원
ㄴ.기술자---공군이나 해군등 기술진이나 북한정부 행정요원으로 귀순
ㄷ.당과 행정. 외교관료---허가이등
허가이는 소련정치담당 고문으로 노동당 조직부장으로 남로당과 북로당 합당을 총지휘했으며 허가이는 남로당 박헌영 보증인으로 한국전쟁이후 남로당 패전 책임과 박헌영등과 무장봉기 시도를 하다가 미국의 간첩으로 박헌영등과 함께 처형되었다
*스탈린은 이후에도 당 사업 경험이 있는 재소(在蘇) 고려인 허가이를 보내 조선노동당 사업을 주관하도록 했다
*허가이의 장인 최표덕 전 북한군 딴크(탱크)장갑차 사령관

*남북노동당 합당 총지휘자 허가이
허가이는 1948년 9월 남북노동당의 통합 이래 사실상 당 조직을 관장해왔는데, 한국전쟁 중에 유엔군의 반격으로 퇴각할 때 행한 당원들의 행동에 지나치게 엄벌주의를 적용해 문제가 되었다. 후퇴 시의 다급한 상황에서 많은 당원들이 당증을 몸에 지니지 못하고 땅에 묻거나 없애버렸다. 이에 대해 허가이가 지도하는 조직위원회는 전시의 위급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처벌위주로 일관했던 것이다. 전체 당원 60만 명 가운데 45만 명이 책벌을 받았을 정도로 이 문제는 심각했다. 그러자 1951년 9월 1일 당 중앙조직위원회를 열어 가혹한 책벌을 완화하라고 지시했으나 그 지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문제가 된 것은 관문주의적 경향이었다. 전쟁중에 핵심정예당원들이 많이 사망했기 때문에 새로운 당원들을 충원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 정비 관계자들은 노동자 성분비율이나 정치의식 수준만을 따져 입당 희망자들을 물리치고 있었다. 이러다 보니 당이 전반적으로 관료주의와 형식주의에 젖어들었다. 이런 책임을 물어 김일성은 허가이를 제1비서 자리에서 해임시키고, 대신 박정애를 당 비서 겸 정치위원으로 선출했다. 당 비서에서 해임된 허가이는 농업담당 부수상으로 좌천되었으며, 1953년 7월 미군 폭격으로 무너진 순안저수지 복구사업을 현장 지휘하라는 김일성의 지시를 받았지만 그에 불복하고 자살했다.
2.소련파 거두 허가이는 타살됐다
광복 직후 북한정권 수립 당시 핵심역할을 했던 소련파 한인 거두 허가이 전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자살이라는 북한당국의 공식발표와 달리 총에 맞아 타살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과 강인구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위원은 13일 통일연구원이 한국학술재단의 후원으로 개최한 ’북한사회주의체제의 형성과 변화: 해외구술자료를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공동발제문에서 허가이의 딸과 친지들의 증언을 인용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 연구원은 의사의 검진 없이 가족이나 친지의 입회조차 하지 않은 채 급히 매장이 이뤄졌고, 또 이후 가족과 관련 인사들의 사인규명 노력을 북한당국이 저지한 점 등을 들어 허가이의 사인에 대한 조작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1950년대 말까지 북한에 체류했던 허가이의 딸 허마이야씨는 목격자로부터“어떻게 자살하는 사람이 총으로 자기를 뒤에서 쏜단 말이오. 그 아바이(허가이)가 뒤에서 쏜 총에 맞아 목격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허가이의 또 다른 딸 허리라씨는 아버지가 1908년에 출생, 1953년 7월 2일 사망했다고 증언했다.
1945년 11월 입북한 허가이는 소련의 지원에 힘입어 고속 승진, 북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및 신설된 검열위원회 위원장, 조선노동당 제2부위원장 겸 조직부장, 농업담당 부수상 등을 지냈다.
허가이의 친구인 장학봉씨의 증언에 의하면, 1940년대에 북한에 파견된 소련파 한인은 438명이었다.
그중 우즈베키스탄에서 북한으로 간 사람은 261명이었으며 다시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온 사람은 가장을 잃고 가족만 귀환한 경우를 합쳐 총 62가구에 그쳤다.
북한에서 숙청당하지 않고 생존한 소련파 한인은 방학세 전 중앙검찰소장, 김봉율 전 인민무력부 부부장, 김학인 전 조선혁명박물관장 등 3명 뿐이었다./연합
*허가이의 딸 허가이리라 알렉세이예브나에 의하면, 허가이의 가족들도 하얼빈으로 이동하여 생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래 사진 설명: 소련군정 및 북로당 간부들
앞줄 우로부터 허가이. 김일성. 소련정치사령관 레베데프 소령. 김두봉. 소련군 정치국장 이그나치포 대좌. 김책 뒷줄 우로부터 주영하. 박일만. 최창익등(북로당과 남침세력)
'-平和大忍, 信望愛. > 韓中日 동북아역사(한자언어문화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국 독도연구소 설립(중국 국제방송) (0) | 2008.08.17 |
|---|---|
|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포유류 화석 효고현에서 발견돼 (0) | 2008.06.12 |
| 반미전선의 한계 "박헌영의 미제간첩 처형과 임표 반란사건" (0) | 2008.05.31 |
| 부시대통령과 올메르트 총리 이스라엘 마사다 요새 방문 사진 (0) | 2008.05.16 |
| 호지명-조국 베트남을 벗 삼아 살아기 때문에 그의 2세가 없는 혁명가 일생 (0) | 2008.0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