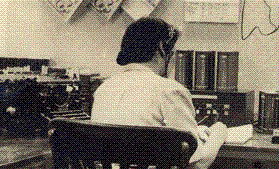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북한 예술영화 <양반전> 보기 본문
조선영화 <량반전> 동영상(심양주재 조선령사관 제공)
첨부된 파일
| 축소도/다운로드 | 원래 파일명 | 류형 | 크기(K) | 설명 |
 |
moban.wmv | .wmv | 0 | 조선영화 <량반전> 동영상(내부 보기) |
*양반전[兩班傳]
|
박지원(朴趾源 : 1737~1805)이 지은 한문단편소설. |
|
그의 문집 〈연암집 燕巖集〉의 〈방경각외전 放瓊閣外傳〉에 수록되어 있다. 정선 땅에 한 양반이 있었는데 글을 즐겨 읽고 덕이 높았다. 그러나 몹시 가난한 탓에 해마다 관가에서 내는 환자(還子)를 타먹다 보니 어느덧 1,000 섬의 빚을 지게 되었다. 관찰사가 이 고을 관공의 출납을 살펴보다가 이 사실을 알고 한편 가엾게 생각했지만 잡아 가두도록 했다. 양반은 대책 없이 울기만 했고 아내는 기가 막혀 "양반(兩班 : 한냥 반)은커녕 한푼어치도 안 된다"고 글만 읽을 줄 알지 무능하기 짝이 없는 남편을 비웃었다. 고을의 부자 한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비밀리에 가족회의를 열어 "양반은 가난해도 영광스럽지만 우리는 남부럽지 않으나 늘 천하게만 굴어야 한다. 이 기회에 양반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양반자리를 사오자"라고 결정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양반은 크게 기뻐하며 승낙했고 부자는 빚을 갚았다. 군수는 크게 놀라 양반을 찾아갔으나 양반은 벙거지에 베잠방이를 입고 길바닥에 엎드려 "쇤네 쇤네" 하는 것이었다. 군수는 "곡식이 많되 아끼지 않고 남의 어려움을 돌봐 주고 높은 자리를 그리워하니 참된 양반이다"라면서 부자를 치켜세운 뒤, 중요한 일이니 증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온 고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모았다. 문서를 만들면서 군수는 양반이 지켜야 할 덕목과 행동을 일일이 열거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5경(五更)에 일어나 등불 켜고 〈동래박의 東來博義〉처럼 어려운 글을 얼음 위에 박 밀듯 읽어야 하며 아무리 배고프고 추워도 참아야 하며 기침·양치질·세수 등을 할 때도 조심스러워야 하고……아무리 더워도 벗지 말고 아무리 추워도 화롯전에 손을 쬐지 말며……" 그리고는 이를 어겼을 때는 양반자격을 박탈한다고 했다. 부자가 "양반이 겨우 이런 것이라면 곡식만 빼앗긴 셈이니 이롭게 고쳐달라"고 불만을 나타내자 군수는 다시 문서를 아래와 같이 고쳤다. "세상에 양반보다 더 큰 이문은 없다. 역사를 대충 알기만 하면 과거를 치러 문과나 진사가 되는데 문과의 홍패(紅牌)는 돈자루나 다름없다. 남인(南人)들에게 잘 보이면 수령이 되어 기생과 놀아나며 뜰에 쌓인 곡식으로 학이나 기른다. 또한 궁한 선비로 시골살이를 하더라도 오히려 무단(武斷)을 행할 수 있다. 이웃의 소로 내 밭을 갈게 하고 동네사람들을 잡아다가 김을 매게 한들 괄시할 자가 없다. 코에 잿물을 따르고 상투를 범벅이며 수염을 뽑더라도 원망하지 못하리라." 여기까지 들은 부자는 어처구니없어 하며 "날더러 도둑놈이 되라는 소리냐"면서 달아나버렸다. 그뒤로 부자는 평생 '양반'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았다고 한다.
박지원은 이 작품을 통해 양반의 형식주의와 비인간적인 횡포를 구체적이고 희화적(戱畵的)으로 풍자하고 있다. 스스로 자서(自序)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지금 소위 선비들은 명절(名節)을 닦기에는 힘쓰지 않고 부질없이 문벌(門閥)만을 기화(奇貨)로 여겨 그의 세덕(世德)을 팔고 사게 되니, 이야말로 장사치에 비해서 무엇이 낫겠는가. 이에 나는 〈양반전〉을 써 보았노라"라고 창작 경위를 밝히고 있다. 이 작품을 가난한 양반과 부자 사이의 양반 매매사건을 같은 양반인 군수의 재치로써 파기시킨 것을 그린 골계소설로 보는 견해도 있다.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잘 나타낸 뛰어난 작품이다.
|
'Guide Ear&Bird's Eye13 > 통일부 정책모니터링조사 패널(수집)' 카테고리의 다른 글
| 日 대북방송국도 北에 ‘풍선 전단’ 살포한다 납치피해자 해결 촉구…10만장 3-4월중에 (0) | 2007.03.06 |
|---|---|
|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해설자료 (통일부) (0) | 2007.03.02 |
| 북한 예술영화 <춘향전> 보기 (0) | 2007.01.28 |
| 북한영화 <흥부전> 보기 (0) | 2007.01.28 |
| 북한 예술영화 <임진왜란> 보기 (0) | 2007.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