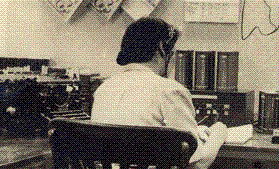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스크랩] 우주 기술로 먹거리 해결하는 중국 본문
[한국일보 2005.01.26 18:52:22]
영국 민화 ‘잭과 콩 나무’에는 하룻밤 사이 하늘과 땅을 이을 만큼 쑥쑥 자란 거대한 돌연변이 콩 나무가 등장한다. 만약 그렇게 큰 콩 나무가 이 세상에 정말 있다면 거기서 열릴 주먹만한 콩을 요리해 먹는 재미도 쏠쏠하지 않을까.
지난해 12월 찾은 중국 베이징 북쪽 샤오탕산(小湯山)의 현대농업과기원예원은 대형 콩 나무와 맞먹는 ‘꿈의 작물’이 자라는 곳이다. 식물을 중심으로 한 생명공학 연구의 총 집산지인 샤오탕산 원예원의 최고 명물은 우주에 갔다 온 씨앗을 심어 기른, 이른바 ‘우주 육종(育種)’이다.
가로 11㎞, 세로 10㎞ 규모의 대형 농장을 들어서면 새하얀 비둘기 떼가 눈에 띈다. 유기농 농산물만 먹고 자라 깨끗하기 그지 없는 비둘기들을 지나 비닐하우스에 들어서니 2㎙를 훌쩍 넘긴 대형 토마토가 눈길을 끈다. 굵은 가지에는 보기만 해도 탐스러운 커다란 토마토가 빽빽이 맺혀 있다.
바로 옆은 오이 밭이다. 아직 꽃이 떨어지지 않은 어린 오이들이 촘촘하다. 한 그루인데도 굵은 덩굴이 흡사 대여섯 개를 합쳐 놓은 것처럼 커다랗다. 맺혀 있는 오이 수도 그만큼 많다. 우주에 다녀온 씨앗으로 재배했다는 난(蘭)은 꽃의 빛깔이 오묘하고 송이가 자잘한 것이 안개꽃 같다. 기자를 안내하던 원예원 관리인이 토마토 몇 개를 따서 건넨다.
“이 작물들은 모두 우주를 다녀온 것들입니다. 중국은 미래의 먹거리 해결을 위해 1980년대 말부터 위성이나 우주선에 씨앗을 함께 실어 보내고 있습니다. 되돌아오면 이를 심어 연구를 하지요. 우주에 다녀온 씨앗들은 놀랍게도 유전자 형질이 크게 변해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 우주에 다녀온 씨앗의 20% 정도는 열매가 많이 맺히고 병균에 대한 저항력이 커지는 등 인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자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0억 명이 넘는 국민의 먹거리 해결이 최우선 과제인 중국 정부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우주 육종은 우주 정거장 ‘미르’에서 길게는 1년씩 생활했던 구 소련 우주인들이 무거운 식량을 줄이고자 고민한 데서 비롯됐다. 1960~70년대 우주인들은 씨앗을 우주 공간으로 가져가 직접 재배해 먹으면 정기적인 식량 배달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밀 양파 등을 시험적으로 심어보았다. 극한 환경에서 식물이 자라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식물의 성장속도는 지구보다 빨랐으며 놀랍게도 녹두 등 두(豆)류는 단백질 함량까지 높았다.
지상 200~400㎞의 무중력 우주 공간을 다녀온 씨앗의 유전자가 왜 변하는지는 밝혀진 게 없다. 다만 무중력 상태와 우주 방사선 등 지구에 없는 특수한 환경이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중국은 1987년부터 본격적으로 위성에 씨앗을 실어 보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우주를 다녀온 종자만 벼 밀 유채 피망 오이 토마토 파 수박 등 800여 종에 달한다. 99년에는 황기 영지버섯 등 약재로 쓸 수 있는 식물의 씨앗도 우주를 향했다. 돌아온 종자는 중국 전역 109개 과학연구 및 생산업체에 나뉘어 심어진 후 심층 연구되고 있다. 샤오탕산 원예원은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농장이다.
“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우주에 다녀온 벼는 평균 약 20%, 밀은 9%씩 생산량 증가를 보였지요. 토마토와 오이는 수확량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맛이 좋고 오래 두어도 썩지 않는 특성을 보였습니다. 피망은 1개의 무게가 750g에 육박할 정도로 커졌고 비타민C 함량도 10~25% 증가했어요.”
지난 8년간의 성과를 설명하는 관리인의 얼굴에 활기가 넘친다. 메벼가 찰벼로 변하고 벼의 생장 기간이 평균 12일 줄었으며 ‘붉은 곰팡이병’에 시달리던 밀의 저항력이 급격히 높아지는 등 고무적인 연구 결과가 잇따랐다.
특히 이 같은 돌연변이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중국의 미래 먹거리 해결에 큰 희망을 주고 있다. 예컨대 80년대 말 우주에 다녀온 볍씨로 재배한 ‘농칸(農墾) 58’은 2세대에서 줄기의 굵기가 고르지 않아 한 때 실패작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3세대부터는 건강한 품종들이 더 많아졌고 현재 재배 중인 4세대는 안정 궤도에 올라서 한 묘(약 30평)당 600㎞이라는 놀라운 생산량을 자랑한다.
우주 육종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위성 및 우주선이 우주로 갔다가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우주 왕복 기술’이다. 현재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등 3개국 뿐이다. 이 중에서 중국은 우주 육종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집채만한 호박이나 주먹만한 콩 등 겉보기가 더 충격적인 작물이 없느냐”는 질문에 관리인이 웃으며 답한다. “처음에는 저희도 신기해서 그런 작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녀석들은 재미는 있어도 갖다 팔기가 어렵고 요리해 먹기도 불편해요. 씨앗 1g을 우주에 올려보내는데 드는 비용은 ?2,000 달러로 굉장히 비쌉니다. 겉보기보다는 실용성을 우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이징=김신영 ddalgi@hk.co.kr)
영국 민화 ‘잭과 콩 나무’에는 하룻밤 사이 하늘과 땅을 이을 만큼 쑥쑥 자란 거대한 돌연변이 콩 나무가 등장한다. 만약 그렇게 큰 콩 나무가 이 세상에 정말 있다면 거기서 열릴 주먹만한 콩을 요리해 먹는 재미도 쏠쏠하지 않을까.
지난해 12월 찾은 중국 베이징 북쪽 샤오탕산(小湯山)의 현대농업과기원예원은 대형 콩 나무와 맞먹는 ‘꿈의 작물’이 자라는 곳이다. 식물을 중심으로 한 생명공학 연구의 총 집산지인 샤오탕산 원예원의 최고 명물은 우주에 갔다 온 씨앗을 심어 기른, 이른바 ‘우주 육종(育種)’이다.
가로 11㎞, 세로 10㎞ 규모의 대형 농장을 들어서면 새하얀 비둘기 떼가 눈에 띈다. 유기농 농산물만 먹고 자라 깨끗하기 그지 없는 비둘기들을 지나 비닐하우스에 들어서니 2㎙를 훌쩍 넘긴 대형 토마토가 눈길을 끈다. 굵은 가지에는 보기만 해도 탐스러운 커다란 토마토가 빽빽이 맺혀 있다.
바로 옆은 오이 밭이다. 아직 꽃이 떨어지지 않은 어린 오이들이 촘촘하다. 한 그루인데도 굵은 덩굴이 흡사 대여섯 개를 합쳐 놓은 것처럼 커다랗다. 맺혀 있는 오이 수도 그만큼 많다. 우주에 다녀온 씨앗으로 재배했다는 난(蘭)은 꽃의 빛깔이 오묘하고 송이가 자잘한 것이 안개꽃 같다. 기자를 안내하던 원예원 관리인이 토마토 몇 개를 따서 건넨다.
“이 작물들은 모두 우주를 다녀온 것들입니다. 중국은 미래의 먹거리 해결을 위해 1980년대 말부터 위성이나 우주선에 씨앗을 함께 실어 보내고 있습니다. 되돌아오면 이를 심어 연구를 하지요. 우주에 다녀온 씨앗들은 놀랍게도 유전자 형질이 크게 변해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 우주에 다녀온 씨앗의 20% 정도는 열매가 많이 맺히고 병균에 대한 저항력이 커지는 등 인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자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0억 명이 넘는 국민의 먹거리 해결이 최우선 과제인 중국 정부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우주 육종은 우주 정거장 ‘미르’에서 길게는 1년씩 생활했던 구 소련 우주인들이 무거운 식량을 줄이고자 고민한 데서 비롯됐다. 1960~70년대 우주인들은 씨앗을 우주 공간으로 가져가 직접 재배해 먹으면 정기적인 식량 배달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밀 양파 등을 시험적으로 심어보았다. 극한 환경에서 식물이 자라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식물의 성장속도는 지구보다 빨랐으며 놀랍게도 녹두 등 두(豆)류는 단백질 함량까지 높았다.
지상 200~400㎞의 무중력 우주 공간을 다녀온 씨앗의 유전자가 왜 변하는지는 밝혀진 게 없다. 다만 무중력 상태와 우주 방사선 등 지구에 없는 특수한 환경이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중국은 1987년부터 본격적으로 위성에 씨앗을 실어 보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우주를 다녀온 종자만 벼 밀 유채 피망 오이 토마토 파 수박 등 800여 종에 달한다. 99년에는 황기 영지버섯 등 약재로 쓸 수 있는 식물의 씨앗도 우주를 향했다. 돌아온 종자는 중국 전역 109개 과학연구 및 생산업체에 나뉘어 심어진 후 심층 연구되고 있다. 샤오탕산 원예원은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농장이다.
“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우주에 다녀온 벼는 평균 약 20%, 밀은 9%씩 생산량 증가를 보였지요. 토마토와 오이는 수확량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맛이 좋고 오래 두어도 썩지 않는 특성을 보였습니다. 피망은 1개의 무게가 750g에 육박할 정도로 커졌고 비타민C 함량도 10~25% 증가했어요.”
지난 8년간의 성과를 설명하는 관리인의 얼굴에 활기가 넘친다. 메벼가 찰벼로 변하고 벼의 생장 기간이 평균 12일 줄었으며 ‘붉은 곰팡이병’에 시달리던 밀의 저항력이 급격히 높아지는 등 고무적인 연구 결과가 잇따랐다.
특히 이 같은 돌연변이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중국의 미래 먹거리 해결에 큰 희망을 주고 있다. 예컨대 80년대 말 우주에 다녀온 볍씨로 재배한 ‘농칸(農墾) 58’은 2세대에서 줄기의 굵기가 고르지 않아 한 때 실패작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3세대부터는 건강한 품종들이 더 많아졌고 현재 재배 중인 4세대는 안정 궤도에 올라서 한 묘(약 30평)당 600㎞이라는 놀라운 생산량을 자랑한다.
우주 육종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위성 및 우주선이 우주로 갔다가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우주 왕복 기술’이다. 현재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등 3개국 뿐이다. 이 중에서 중국은 우주 육종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집채만한 호박이나 주먹만한 콩 등 겉보기가 더 충격적인 작물이 없느냐”는 질문에 관리인이 웃으며 답한다. “처음에는 저희도 신기해서 그런 작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녀석들은 재미는 있어도 갖다 팔기가 어렵고 요리해 먹기도 불편해요. 씨앗 1g을 우주에 올려보내는데 드는 비용은 ?2,000 달러로 굉장히 비쌉니다. 겉보기보다는 실용성을 우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이징=김신영 ddalgi@hk.co.kr)
출처 : 아시아연방론
글쓴이 : 아리랑목동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