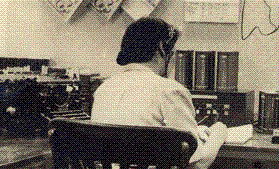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조선혁명군 총사령관 양세봉 장군을 찾아서 본문
조선혁명군 총사령관 양세봉 장군을 찾아서
춘천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의병마을’에서 항일의병 유적을 찾는 테마 여행을 기획했다. 중국의 랴오닝성(遼寧省) 일대를 5박 6일 동안 둘러본다고 하여 2006년 10월 22일 06:30분. 춘천 공설운동장을 출발. 71명이 장정에 올랐다.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서자 꾸물거리던 날씨가 비를 뿌렸다. 12:45분발 심양(深陽)행 비행기가 한 시간이 넘게 연발했다. 3시 반이 넘어서야 심양 공항에 착륙했다. 중국과 시차가 1시간이니 한국은 지금 4시 반이다. 이곳도 비가 오고 안개가 자욱하여 창밖 경치는 볼 수 없었다. 2시간이면 간다던 버스는 3시간이 지나서야 신빈(新賓)에 여장을 풀게 했다.
이튼 날 아침. 시골 길을 달려 왕청먼(旺淸門)으로 갔다. 왕청먼은 한 때 ‘한국독립운동의 수도(首都)’로 불리던 곳이다. 1920년대 말에 만주의 독립군 통합부인 ‘국민부’가 있었고, 1930년대에는 조선혁명군의 본부가 있던 곳이다. 주변의 조선족들이 왕청먼에 갈 때는 “서울에 간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번창했다는데 이제는 한적한 시골마을이다. 조선족 촌엔 빈집이 늘어가고 마을 한복판에 있던 ‘조선족학교’도 폐교 되어 골격만 앙상하다.
풀밭이 되어버린 교정에 양세봉(梁世奉:1896~1934)의 흉상만 쓸쓸하다. ‘抗日名將 梁瑞鳳’(양세봉의 다른 이름)이란 글과 함께 흉상을 중국정부에서 1995년에 건립했단다.
양세봉은 평북 철산 출신으로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났다. 1917년 가족과 함께 압록강을 건너 정착했다. 3·1운동 이후 만주 일대가 독립운동의 전초기지화 되었다. 많은 애국지사들이 항일운동에 참여하자 양세봉은 1920년에 대한독립단에 투신한다.
1929년 조선혁명군이 신빈에서 결성되자 제1중대장을 맡았고 1931년에는 조선혁명군 총사령관이 되어 남만주지역의 무장투쟁을 이끌었다.
일제가 만주사변(1931년 9. 18)을 일으켜 만주국을 세우고 항일운동에 대한 탄압을 가하자 사회주의 계열의 항일단체는 중국 공산당으로 가고 민족주의 계열은 상해 등지로 건너가 만주에서 독립운동이 위축되었지만 남만주에서 항일투쟁은 계속됐다.
그는 부하들을 잘 다스려 독립군들에게는 ‘군신’으로 동포들에게는 ‘소작농 장군’으로 추앙받았다. 독립운동사에서 양 장군처럼 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10년 가까이 투쟁을 벌인 인물은 흔치 않다.
1934년 8월(음력). 일제는 밀정을 내세워 ‘중국 마적단이 조선혁명군과 연합할 뜻이 있으니 논의하자’고 유인해 신빈현 소황구에서 살해당했는데 38세의 한창 나이였다.
양세봉은 동작동 국립 현충원 애국지사 묘역과 평양의 애국열사릉에 나란히 모셔져 있다. 한 인물이 남북한의 국립묘지에 나란히 안장된 경우는 양세봉뿐이다.
한국은 1962년에 양세봉 등 조선혁명군 관계자들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어 1974년에 현충원에 유골이 없는 허묘(虛墓)를 만들었고 북한은 1960년에 양세봉의 무덤을 평양 근교로 이장한 후 1986년 9월 평양 애국열사릉에 안치했다.
*조선혁명군과 한국 독립군 그리고 양세봉
1920년대 후반에는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되었고, 이에 따라 만주의 독립 운동 단체들도 통합 운동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1928년 만주에 모여 있던 18 개의 독립 운동 단체 대표 39 명이 모여 민족 유일당 촉성 문제를 협의하였다. 그 결과, 완전한 통일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전민족 유일당 조직 촉성회와 전민족 유일당 조직 협의회의 두 단체로 대립되었다. 협의회는 정의부가 중심이 되어 참의부, 신민부와의 통합 운동을 벌여, 완전한 통합은 아니지만 신민부의 민정파와 참의부의 일부 세력을 합쳐 국민부를 조직하였다.
한편, 촉성회는 재만 책진회(일명 혁신 의회)를 거쳐 김좌진을 중심으로 하는 한족 총연합회로 개편되었다.
국민부는 남만주 지역의 유일당으로 조선 혁명당을 조직하고, 여기에 소속된 군대로 조선 혁명군을 편성하였다. 조선 혁명당 중앙 부서의 간부는 중앙 집행 위원장 현정경,조직 부장 고할신, 군사 위원장 이웅, 자치 위원장 현익철, 민중 부장 고이허 등이었다.
또 조선 혁명군은 총사령 양세봉이 지휘하였으며, 중국 의용군과 연합 작전을 벌여 흥경성 영릉가에서 일본군, 만주군과 격전을 벌여 크게 승리하였다.
한족 총연합회는 위원장 김좌진이 공산당원의 조종을 받은 박상실에 의하여 피살된 후, 한국 독립당으로 발전하였다.
북만주 지역의 유일당으로 조직된 한국 독립당은 중앙 위원장 남대관, 군사 위원장 지청천 등이 중심 인물들이었으며, 그 산하에 총사령 지청천이 지휘하는 한국 독립군을 거느렸다.
한국 독립군은 중국 호로군과 한중 연합 작전을 벌여 1932년 쌍성보 전투, 1932년 12월의 경박호 전투, 1933년 4월의 사도하자전투, 1933년 7월의 동경성 전투 등에서 승리하였다.
1.조선혁명군
1929년 만주지역에서 활약한 항일 무장군. 1929년 3월 만주 길림시 우마행오동(牛馬行胡洞) 거리의 국민부 사무소에서 항일 투쟁의 지도자들이 모여 남만주일대의 유일 혁명군 정부인 국민부를 지지, 육성하기 위하여 조직한 조선혁명당의 당군(黨軍)이다.
조선혁명당 중앙당부는 7부 3위원회로 편성하였는데, 이 중 군사위원회 밑에 국민부의 군대를 당군으로 개편하여 조선혁명군이라 부르고 당의 통솔하에 들어가게 하였다. 편제가 갖추어진 것은 같은 해 5월 조선혁명당의 중앙집행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인 것 같다.
그 뒤 일본군 및 만주군의 연합 부대와의 항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를 내게 되어 1932년 초에는 무장 부대의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져 총사령관에 양세봉, 참모장에 김학규가 임명됨으로써 새로이 대오를 가다듬고 본격적인 항일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1934년 9월 일본군과 격전을 치르면서 총사령 양세봉이 전사한 뒤 김호석(金浩石)이 총사령에 임명되면서부터 일본군 대부대의 본격적인 공격이 전개되어 그 세력이 점차 약화되어갔다. 1935년 9월 반만 항일군의 지도자 왕봉각(王鳳閣)과 중한항일동맹회(中韓抗日同盟會)를 결성, 공동 항일 전선을 펴 세력 만회에 힘썼으나 1936년을 고비로 쇠퇴되었다.
이 혁명군의 항일 무장투쟁은 일본군과의 단독 전투와 중국군과의 연합 전투를 통하여 항일무장투쟁사에 크게 공헌하였다. 그중에서도 1929년 7월의 유하현 추가보(柳河縣鄒家堡)전투, 1932년 2월 양기하(梁基瑕) 부대의 혈투 등이 있었고, 특히 1932년 3월에서 7월에 걸친 흥경현 영릉가(興京縣永陵街) 전투는 정규전을 벌여 일본군을 크게 무찌른 대승첩이었다.
이 전투는 총사령 양세봉의 병력 1만여 명과 중국의용군총사령 이춘윤의 병력 2만여 명이 연합 전선을 펴 일본ㆍ만주 연합군을 크게 무찔렀는데, 3월의 초전에서 일본군 사상자 30여명을 내고, 5월과 7월에 다시 공군의 지원까지 받은 일본의 대부대와 영릉가에서 접전하여 일본군으로 하여금 전후 100여 명의 사상자를 내게 하는 대전과를 거두었다. 이 혁명군의 전투는 1931년의 만주사변 이후 크게 증강된 일본군의 대부대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무장독립투쟁으로서의 의의가 크다.
2.한국독립군
1920년대 후반에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되어, 이에 따라 만주의 독립운동 단체들도 통합운동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1928년에 만주에 있는 18개의 독립운동 단체 대표 39인이 모여 민족 유일당 촉성문제를 협의하였다. 그 결과, 완전한 통일은 이루지 못하고, 전 민족 유일당 조직 촉성회와 전 민족 유일당 조직 협의회의 두 단체로 대립되었다.
협의회는 정의부가 중심이 되어 참의부, 신민부와의 통합운동을 벌여, 완전한 통합은 아니지만 신민부의 민정파와 참의부의 일부 세력을 합쳐 국민부를 조직하였다. 한편, 촉성회는 재만 책진회(일명 혁신 의회)를 거쳐 김좌진을 중심으로 하는 한족 총연합회로 개편되었다.
국민부는 남만주 지역의 유일당으로 조선 혁명당을 조직하고, 여기에 소속된 군대로 조선 혁명군을 편성하였다. 조선 혁명단 중앙 부서는 중앙집행위원장 현정경, 조직부장 고할신, 군사위원장 이웅, 자치위원장 현익철, 민중부장 고이허 등이었다.
한족 총연합회는 위원장 김좌진이 공산당원의 조종을 받은 박상실에 의하여 피살된 후, 한국독립당으로 발전하였다. 북만주 지역의 유일당으로 조직된 한국독립당은 중앙위원장 홍진, 총무위원장 신숙, 조직위원장 남대관, 군사위원장 이청천 등이 중심이었으며, 그 산하에 총사령관 이청천이 지휘하는 한국독립군을 거느렸다.
한국독립군은 중국 군대와 한중연합군을 결성하여 1932년 9월의 쌍성보 전투, 1932년 12월의 경박호 전투, 1933년 3월의 사도하자 전투, 1933년 7월의 동경성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3.양세봉
1932년 일본군이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를 장악하자 중국의용군 총사령관 리춘룬[李春潤]과 한중연합군을 편성해 그해 3월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는 융링제성[永陵街城]을 탈환하고 상자 강[上夾河]까지 점령했다. 이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조선혁명군은 산하에 5개로(五個路) 사령부를 거느리는 대부대로 개편하고 그는 총사령관에 취임했다. 혁명군을 보충하기 위해 조선혁명군속성군관학교를 설립, 교장을 맡아 사관을 양성하고 군대를 훈련시켰다. 1933년 2월 요녕구국회(遼寧救國會) 영수인 왕위원[王育文]·탕쥐우[唐聚伍]와 혁명군 대표 김학규(金學奎)가 회합해 '한중군합작항일공작'을 결성하는 협상이 이루어져 요녕민중자위군총사령부 내에 설치한 특무대사령에 취임했다. 그러나 일본 관동군사령부는 대병력을 파견해 전만주에 걸친 행동을 개시, 1933년 5월 영릉가로 진격해 한중연합군은 패퇴했다. 1934년 3월 이후 그는 박대호(朴大浩) 등 반만군(反滿軍)과 관뎬 현[寬甸縣]을 중심으로 항일투쟁을 계속했으며, 싱징 현[興京縣]을 습격하기 위해 수백 명을 동원하기도 하고, 중국의용군 덩톄메이[鄧鐵梅]와 합류해 북만주에서 군자금을 모집하기도 했다. 그러나 1934년 8월 12일 일본군의 밀정에게 속아 타이라쯔거우[太拉子溝]에서 일본군에게 사살되었다.
양세봉은 동작동 국립 현충원 애국지사 묘역과 평양의 애국열사릉에 나란히 모셔져 있다. 한 인물이 남북한의 국립묘지에 나란히 안장된 경우는 양세봉뿐이다.
한국은 1962년에 양세봉 등 조선혁명군 관계자들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어 1974년에 현충원에 유골이 없는 허묘(虛墓)를 만들었고 북한은 1960년에 양세봉의 무덤을 평양 근교로 이장한 후 1986년 9월 평양 애국열사릉에 안치했다.
'-平和大忍, 信望愛. > 韓中日 동북아역사(한자언어문화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러,중 문화공연 "러시아어의 해" (0) | 2009.03.29 |
|---|---|
| 북한 묘향산 보현사(사진) (0) | 2009.03.29 |
| 타도제국주의 동맹과 반제청년동맹 (0) | 2009.03.24 |
| “조선국민회 모임 주도자 김형직 아니다” (0) | 2009.03.24 |
| 땅 0.0026% 한국인 소유라고 대마도가 위험? (0) | 2009.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