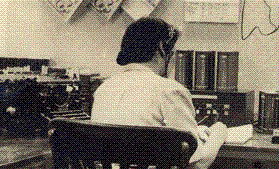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국군포로 소련 이송 확증 없었다” - 이문항씨 본문
“국군포로 소련 이송 확증 없었다” - 이문항씨
CIA Bear 허관(許灌) 2007. 4. 14. 17:00한국전쟁 당시, 수천 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에서 소련으로 끌려갔으며,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않은 사실이 미국 국방부 비밀해제 문서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주한 유엔군사령관 정전담당 특별고문을 지낸 이문항 씨는 1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당시 전쟁포로의 소련 이송에 대한 의혹은 있었지만, 물증이 없었다며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주한 유엔군사령관 정전담당 특별고문 출신으로 정전협정의 산 증인인 이문항씨는 정전협정 당시, 전쟁포로들의 러시아 이송 의혹이 제기되긴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문항: 러시아로의 포로 이송에 대한 얘기는 들었습니다. 비행사, 조종사중 추락한 사람들 데려갔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판문점 회담에 올라가서 이 문제를 제시하면서 비난을 한다던가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했다던 가 했던 적은 없습니다.
지금은 은퇴해 워싱턴 근교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 이문항씨는, 특히 미군이 러시아로 이송된 것이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리 없다며 의문을 던졌습니다.
이문항: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죠. 전쟁 끝나고 포로교환한 지가 53년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벌써 몇 년 입니까? 50년이 다 되갑니다./ 만일에 미군 현역군인 포로들이 러시아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죽은 미군의 유해도 발굴하러 가는 판인데. 산사람이 있다는 게 확실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언론을 통해 공개된, ‘한국전쟁 포로들의 소련이동 보고서’는 국군 포로들이 끌려간 장소와 생활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전쟁 당시 미군 포로의 러시아 생존여부 확인과 유해 반환을 위해 만든 조직인 ‘미국.러시아 전쟁 포로.실종자 공동위원회’가 지난 1993년 작성한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군포로 등의 소련 압송은 지난 51년 11월부터 52년 4월까지 이뤄졌습니다. 수송경로는 첫 째, 기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지타(Chita)를 경유해 당시 몰로토프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송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바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주로 국군과 남한 정치인들로 구성된 포로들이 오호츠크(Okhotsk) 등 소련 극동 항구로 이동돼, 이 곳에서 야쿠츠크(Yakutsk) 주변의 악명 높은 콜리마(Kolyma) 수용소나 추크치 해(Chukotsk Sea)의 반카렘(Vankarem) 지방으로 보내졌습니다. 추크치 해로는 최고 만 2천명의 포로들이 이송됐는데, 이들은 도로공사와 비행장 건설 등에 동원돼 사망하는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러시아로 이동된 포로들은, 또한 간첩 교육까지 강요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에서 공개된, 1953년 2월 24일자 미 육군 한국정보활동 연합사령부 비망록에는 “소련은 1952년 10월 시베리아의 우란(Uran), 호다송(Hodasong)에 고등정보원양성팀을 설립했다. 500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 이 중 3분의 1이 여성이었다. 일본인이 가장 많고 그 외는 한국인, 필리핀인, 버마인, 미국인이다”라고 기록 돼 있습니다.
한편, 1950년 시작된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됨으로서 37개월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당시 남한은 국군 8만 2천 여 명이 북측에 포로로 억류돼있다고 추정했지만, 고작 8천 300여 명 만을 송환받은 채 협상이 종료되었습니다. 반면 북한 측에는 7만 6천 여 명이 인도됐습니다.
워싱턴-이진희
'Guide Ear&Bird's Eye13 > 통일부 정책모니터링조사 패널(수집)'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임종석의원 "개성공단진출 기업 지원을 위한 <개성공업지구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0) | 2007.04.14 |
|---|---|
| 란코프 칼럼: 진정한 김일성 (0) | 2007.04.14 |
| 북한의 핵포기 초기조치 기한내 이행 절망적 (0) | 2007.04.14 |
| 북한, BDA 해법 사실상 수용 (0) | 2007.04.14 |
| “중국의 BDA 미해결 언급은 BDA 제재조치에 대한 불만 표시용” - 미 전문가 (0) | 2007.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