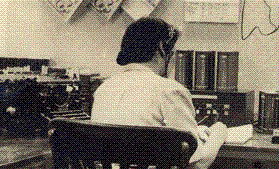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초전도체 등 '별난물질' 연구…사울레스 등 3명 노벨물리학상 본문
초전도체 등 '별난물질' 연구…사울레스 등 3명 노벨물리학상
CIA Bear 허관(許灌) 2016. 10. 9. 18:22
사울레스-홀데인-코스털리츠, 위상기하학을 물질물리학에 적용 "전자공학·미래 양자컴퓨터 발전 기여"
올해 노벨물리학상은 초전도체 등 '별난 물질'(exotic matter)의 연구 방법론을 개척한 데이비드 사울레스(82·미국 워싱턴대 명예교수) 등 영국인 과학자 3명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4일 올해 노벨물리학상의 절반을 사울레스 교수에게, 나머지 절반을 덩컨 홀데인(65) 프린스턴대 교수와 마이클 코스털리츠(73) 브라운대 교수에게 나눠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1970∼1980년대부터 별난 물질의 상태 및 위상 문제를 꾸준히 연구함으로써 물리학은 물론이고 전자공학 발전 가능성을 한층 넓힌 공로를 인정받았다
위원회는 이들의 연구가 "물질의 미스터리를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돌파구를 마련했고 혁신적 물질의 발전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고안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들의 발견은 응집물질물리학 연구를 진흥시켰을 뿐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전자공학과 초전도체 및 미래 양자컴퓨터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수학에서 사용하는 위상(位相) 개념을 물리학에 적용하면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뤄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위상기하학(Topology)은 변형력이 가해졌을 때 변하지 않는 물질과 공간의 위상적 성질을 연구하는 수학 분야다.
노벨위원회는 이들은 위상적 상전이와 물질의 위상적 상을 이론적으로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초전도성이 낮은 온도에서 일어날 수 있고 높은 온도에서는 사라질 수 있다는 위상전이 메커니즘을 증명했다.
위원회는 "이들은 초전도체, 초유동체, 자기 박막 같은 특이한 상태나 위상의 물질을 연구하기 위해 고급수학의 방법론을 활용해 왔다"며 "이런 개척적인 연구 덕분에 오늘날 별난 물질에 대한 추적이 이뤄지고 있고, 많은 이가 재료과학, 전자공학 양쪽에 모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르스 한스 한손 노벨위원회 물리학 위원은 발표장에서 물질의 위상 문제를 설명하면서 도넛 모양의 베이글과 꼬인 고리 모양의 프레첼, 달팽이 무늬 번 등 구멍의 수와 꼬인 정도가 다른 빵을 활용해 물질의 성질과 위상 변화의 차이를 시연해 보이기도 했다.
노벨상 측은 최근 이뤄진 연구 성과가 아니더라도 과거 일군 과학적 성과와 발견이 수십 년간 시간이 흐르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해 수상자를 결정한다.
노벨상 부문별 상금 800만 크로네(약 11억원) 가운데 절반은 사울레스가 받으며 나머지 절반을 홀데인과 코스털리츠가 나눠 받는다.
사울레스 교수는 1934년 스코틀랜드 비어스덴 출생으로 1958년 미국 코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버밍엄대, 워싱턴대 교수를 지냈다. 그는 양자홀 효과와 위상 양자수, 초전도 현상, 핵물질 속성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했다.
1942년 스코틀랜드 애버딘 출신으로 1969년 옥스퍼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코스털리츠 교수는 사울레스 교수와 1970년대 초 버밍엄에서 만나 KT(코스털리츠-사울레스) 상전이를 새로이 이해하는 연구를 함께했다.
두 사람은 1980년대 어떤 물질이 전기를 전도하는지를 결정하는 양자역학 이론 등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의 연구 성과는 20세기 응집물질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으로 평가된다.
홀데인 교수는 1951년 런던에서 태어났으며 1978년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는 전날 생리의학상(오스미 요시노리·일본·'자가포식' 연구)에 이어 발표됐으며 화학상, 평화상, 경제학상, 문학상이 다음 주까지 차례로 발표된다. 시상식은 12월 10일 열린다.
노벨물리학상, '별난물질' 연구 영국 출신 과학자 3인
올해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로 결정된 데이비드 사울레스, 덩컨 홀데인, 마이클 코스털리츠 교수(왼쪽부터).
올해 노벨물리학상은 초전도체 등 ‘별난 물질’(exotic matter) 연구를 개척한 데이비드 사울레스 미국 워싱턴대 교수 등 영국인 과학자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오늘(4일) 올해 노벨물리학상의 절반을 사울레스 교수에게, 나머지 절반을 덩컨 홀데인 미 프린스턴대 교수와 마이클 코스털리츠 미 브라운대 교수에게 나눠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교수 3명은 1970∼1980년대부터 ‘별난 물질’의 상태와 위상 문제를 꾸준히 연구함으로써 물리학은 물론 전자공학 발전 가능성을 한층 넓힌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위원회는 이들이 초전도체나 초유동체, 자기박막 같은 특이한 상태나 위상의 물질을 연구하기 위해 고급수학의 방법론을 활용해 왔다며, 이런 연구 덕분에 오늘날 ‘별난 물질’에 대한 추적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벨상위원회는 앞서 어제는 생리의학상을 발표했으며 이어 화학상과 평화상, 경제학상, 문학상이 다음 주까지 차례로 발표됩니다.
VOA 뉴스
토르스 한스 한손 노벨위원회 물리학 위원이 프레첼과 번, 베이글을 이용해 물질의 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노벨 물리학상 키워드 '상전이(相轉移)'는
올해 노벨물리학 공동 수상자 3명은 학계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1,2차원의 '상전이(相轉移·phase transition)' 이론을 체계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상전이는 기체, 액체, 고체 등의 물질이 열과 전기 등의 자극을 받아 서로 다른 형태로 변하는 물질 변화를 뜻한다. 물이 얼음이 되거나 끓는 물이 기체로 변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동안 상전이 이론은 인간이 생활하는 3차원을 배경으로 활발히 논의됐다. 상대적으로 1차원과 2차원에서의 상전이는 변수가 많고 규명이 어려워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다.
이번에 노벨물리학 공동 수상자들은 학계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1,2차원에서의 물질 회전과 변화 상태를 수식 등을 통해 이론적으로 정리했다.
이날 오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열린 '2016 노벨 물리학상 설명회'에서 박제근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는 "상전이 연구는 10여 년 전부터 노벨 물리학상의 유력한 연구 주제로 떠올랐다"며 "사제지간인 싸울리스와 코스털리츠는 1972년 발표한 기념비적인 2차원 상전이 연구 논문으로 일찌감치 주목받았다"고 말했다.
고병원 고등과학원 물리학부 교수는 "물리학에서 중요한 연구 영역이 1차원과 2차원을 포함한 저차원 분야다. 그 중에서도 2차원은 변수(flustration)가 크고 물리학 개념이 통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연구가 어려운 주제"라며 "올해 노벨물리학 공동 수상자들은 1차원과 2차원에서의 상전이를 종합적으로 규명한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중력파' 제치고 노벨 물리학상 수상한 '위상 상전이'는?
올해 노벨 물리학상에서 '천재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100년만에 규명한 '중력파'를 제치고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1·2차원에서의 '상전이'(phase transition)를 처음으로 이론적으로 밝혀낸 영국 태생 과학자 3명이 공동 수상의 영예를 누렸다.
상전이(相轉移)는 특정 조건이나 환경에서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3차원 물리세계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상전이 현상은 물의 변화다. 저온에서 물이 얼음이 되고 고온에서 수증기가 되는 것이 대표적인 상전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 이전까지 물리학계에서 상전이 연구는 주로 3차원에서만 논의돼왔다. 평면으로 구성된 2차원에서는 규명이 어려웠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고병원 고등과학원 물리학부 교수는 "물리학에서는 저차원이 중요한데 2차원은 3차원보다 변동(flustration)이 커서 연구하기 까다롭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우러스 교수와 그의 제자인 코스탈리츠는 당시 이론을 뒤집고 초전도 현상이 저온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증명했다.
이들은 1972년 이른바 'KT 상전이 이론'으로 불리는 공동논문을 발표해 양자물리학계를 발칵 뒤집어놨다. 'KT'는 논문 저자인 코스탈리츠(Kosterlitz), 사우러스(Thouless) 교수의 이름의 첫글자를 딴 것이다.
1970년 전까지 물리학에서는 2차원 상태에서 상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었다. 하지만 사우러스 교수와 그의 제자인 코스탈리츠는 당시 이론을 뒤집고 초전도 현상이 저온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증명했다.
예를 들어 2차원적 평면바닥에 물을 흩뿌렸을때 저온일 경우에는 물방울들이 소용돌이 모양으로 뭉친다. 하지만 고온이 되면 이들 물방울의 소용돌이 모양이 시계방향과 반(反)시계방향으로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노벨상 위원회도 "이들의 공로로 물질의 새로운 이상상태를 연구할 수 있게 됐으며, 관련 연구가 향후 물질과학이나 전자학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수상 배경을 설명했다.
더욱이 사우러스, 코스탈리츠 교수보다 10년 늦었지만 던컨 홀데인 교수는 1차원에서의 위상 상전이를 이론적으로 규명해 더욱 주목을 받았다.
이들 연구는 향후 물리학과 양자 물리학, 분자학 등 다양한 기초과학의 토대가 됐다. 향후 홀데인 교수의 이론은 위상 절연체 연구에도 영향을 미쳐 양자컴퓨터 개발에도 중요한 이론적 기초가 될 전망이다.
국내 전문가들은 3명의 과학자에게 노벨 물리학상의 영예를 안겼지만 '위상 상전이' 이론은 여전히 심도있는 연구가 이뤄질 대상이라고 평가했다.
박제근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는 "사우러스, 코스탈리츠 교수의 KT 상전이 이론은 양자 고체물리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이라며 "40여년이 지나서 올해 수상할 정도로 파급력이 큰 연구 업적"이라고 강조했다.
*상전이(相轉移, phase transition)
상전이(相轉移, phase transition)는 통계역학적 계의 매개변수를 바꾸는 과정에서 물리적 성질 가운데 일부가 급격하게 변하는 현상이다. 물리적 성질이 매끈하게 변하는 매개변수 구역을 상이라고 한다. 즉, 상전이는 상과 상 사이의 경계다.
상전이라는 개념은 주로 물리학에서 나온 것이지만, 복잡계를 설명할 때에도 사용된다. 즉, 물리학적인 계뿐만이 아니라 생물학적, 사회학적인 계에서도 상전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파울 에렌페스트가 분류한 상전이는 고전적인 상전이 분류라 한다. 이는 자유 에너지의 몇 차 미분에서 불연속점이 있는가를 통한 분류법이다. 그러나 어떤 계에서는 미분이 발산하는 경우가 있어 제한적이다. 현대적인 상전이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1차 상전이에는 잠열(숨은열, Latent Heat)이 관계되어 있다. 상이 바뀔 때, 일정한 양(일반적으로 많은 양)의 잠열을 흡수하거나 내보낸다. 이러한 잠열의 교환이 크기 때문에, 1차 상전이에서는 계 전체가 한꺼번에 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상이 바뀌는 "상이 혼합된 상태"가 된다. 대표적인 예로 끓는 물이 있다. 물이 끓는 것은 물 전체가 한꺼번에 수증기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국소적으로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것이다. 이때 물과 수증기는 열평형을 이룬다. 이런 상이 혼합된 상태는 일반적으로 기술하기가 어렵다.
2차 상전이에서는 잠열이 없기 때문에 상이 연속적으로 바뀐다. 수증기는 압력을 서서히 가해 주면 응축하여 물이 된다. 이는 열에 의해 끓고 식는 것과 다른 현상이다. 따라서 끓는 물에 압력을 가해 주면 나중에는 물과 수증기가 구별이 없어지는 상태가 된다. 이러한 상태를 임계점이라고 한다. 2차 상전이는 이 임계점 위의 상변화를 말한다
-물과 관련된 상으로 물, 얼음, 수증기가 있다. 열을 가하거나 압력을 가해주면 이들이 서로 바뀐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는 물의 상전이는 대부분 1차 상전이로서 잠열이 필요하다. 하지만, 상전이 임계점을 넘는 고온, 고압에서는 2차 상전이가 일어나기도 한다.
-자성체가 외부 온도나 외부 자기마당에 따라서 강자성과 상자성의 성질을 띠는 것이다.
-단백질 접힘이나 생물의 군집 형성에도 상전이 현상이 나타난다.
-금융 시장의 거품 형성 등도 상전이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중력파
뾰족한 마루와 완만한 골모양으로 이루어진 파로 중력이 주요 복원력이다.
*중력
지구가 물체를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
중력은 지상에서의 물체의 운동과 태양계 내의 행성의 운동뿐만 아니라 별, 은하, 더 나아가 우주 전체와 같은 거시적인 물체들의 구조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뉴턴은 천체의 운동이 지상에 있는 물체의 운동과 같은 원리로 설명될 수 있음을 발견했다. 관성법칙에 따라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와 달 사이에 만유인력, 즉 중력이 작용한다고 가정했다.
1916년 아인슈타인은 일반상대성이론이라 불리는 중력장이론을 완성했다. 이 가설의 핵심은 중력이 뉴턴이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힘이 아니라 시공연속체 속의 질량의 존재에 의해 생긴 굽어진 장이라는 것이었다. 현재까지 검증된 이론으로 수성궤도의 장축 회전현상, 태양주변에서의 빛의 굴절, 중력에 의한 빛의 색편이 현상 등이 있다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던 사과는 땅으로 떨어지고, 산골짜기의 폭포수도 우렁찬 소리를 내며 아래로 떨어져요. 또한, 비행기에서 뛰어내린 스카이다이버도 땅으로 떨어지고, 처마 끝에 달린 고드름도 아래로 자랍니다. 이처럼 땅 위의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이유는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때문이에요.
이 힘을 중력이라고 해요.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말해요.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을 향한답니다.
중력은 물체의 질량에 비례해요. 또한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커지는 성질이 있지요.
높은 산에서 숨을 쉬는 것보다 지표면에 가까이 있을 때에 숨을 쉽게 쉴 수 있는 이유도 지표면에서는 중력이 커 많은 대기가 분포하기 때문이랍니다. 따라서 중력의 크기는 측정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중력과 관련된 현상들이 찾아 볼 수 있어요. 폭포가 떨어지는 현상, 고드름이 아래쪽을 향해 맺히는 현상, 식물의 뿌리가 아래로 자라는 현상, 무거운 코끼리의 다리가 가벼운 새의 다리보다 훨씬 굵은 현상 모두 중력과 관계가 있답니다. 사람들 또한 중력으로 인해 땅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우주와 관련된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공중에 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중력이 없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이 없어서 공중에 떠있는 것이랍니다.
지구의 중력은 달의 중력보다 약 6배 큽니다
'Guide Ear&Bird's Eye > 21세기 동아시아인 노벨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밥 딜런 씨, 노벨문학상 메달 건네받아 (0) | 2017.04.03 |
|---|---|
| 노벨문학상, 미국 가수 겸 시인 밥 딜런 선정 (0) | 2016.10.13 |
| 올해 노벨평화상, 평화협정 이끌어낸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 (0) | 2016.10.07 |
| 노벨생리의학상 '자가포식' 연구 오스미 요시노리(大隅良典·71) 일본 도쿄공업대 명예교수 (0) | 2016.10.03 |
| 최연소 노벨 평화상 소녀 말랄라, 지금은? (0) | 2016.10.02 |